모래백사장
본문
백사장의 길이도 지금은 간이 방파제 두 개로 세 통강이 나있었지만 처음에는 2킬로 이상의 긴 백사장이다. 청호동 방파제 끝에서 외용치 까지로 지금도 걸어보고 싶고 발자욱을 남기고 싶은 곳이다. 겨울에는 모래 백사장의 폭이 줄어들었다가 여름에는 폭이 늘어 난다. 파도의 세기가 대체로 겨울에는 세고 여름에는 낮기에 퇴적되는 모래양이 변하기 때문이다.
백사장은 먼 바다에서 온 파도의 종착역을 알리며 부서지는 장소이다. 파도가 왜 백사장에게는 꼼짝을 못할까 그렇게 넘을려고 널름거려도 한계에 이르고 흰 거품을 품고 사라지곤 한다. 어릴 때 파도를 관찰해 보건데 4번은 크게 온다. 그리고 잠잠한 파도가 두 번 오고 다시 큰 파도가 온다. 청호동 어린이들의 담력 시험장은 바로 이 백사장에서 펼쳐지는 다이빙이다. 큰 파도가 와도 그 파도를 밀치고 꺽는 파도 속으로 들어간다. 정신없이 구르다보면 코에 모래가 입에 모래가 씹힌다. 그러면서도 정신을 잃지 않고 솟구쳐 나와서 육지 쪽을 향하여 헤엄쳐 나온다. 그때 심술궂은 파도는 속에서부터 끌어당기면서 내친다. 그래도 살아야한다는 필사의 정신으로 빠져 나오면 담력시험은 끝나고 아이들 세계에서도 담력을 인정을 받는다. 세상의 삶의 소용돌이를 어려서부터 배운다고나 할까 그러기에 우리들에게 파도는 세상을 모질게 사는 법을 배워주는 장소이다. 파도의 성질을 알고 들어가면 4번 구르더라도 작은 파도가 오기 전 빠져 나오면 된다.
백사장에는 무수한 조개가 나뒹구는데 하얀 백사장에 걸맞게 흰 조개이다. 수없이 죽은 조개껍질, 산 놈도 더러 있지만 파도는 이들을 육지로 밀어내곤 스스로 사라진다. 파도에 밀려온 조개껍질이 우리의 삶과 비슷하다. 먼저 밀려온 조개를 다음 파도가 덮어 백사장 밑에 감추고 또 다음 파도가 나중나온 조개를 덮는데 우리의 삶이 이러하다. 북에서 밀려온 아바이 1세대를 묻고, 그 나머지 2세대인 우리도 세월의 파도에 밀려 묻히니 세상만사 자연사와 같지 않을까?
백사장에서 얻는 것 중의 하나는 조개이다. 묘하게도 청초호수 안쪽과 수로에는 검은 모시조개가, 축항 밖 백사장 쪽은 영락없이 흰조개가 경계를 선듯이 잡힌다. 조개잡이는 수영실력에 따라 발가락 내지 다이빙으로 건진다. 발가락으로 건지는 것은 작은 것들이고 좀 더 굵은 놈을 캐려면 잠수해야 한다. 이 조개들은 물이 따뜻하고 파도가 잦을 때에는 낮은 곳에도 나오지만 때로 날이 흐리고 물이 찰 때는 깊은 곳 사람 키 2,3배 깊이에 숨어 있다. 그러나 물속으로 잠수하면 이 조개들은 금방 발각이 된다. 왜냐하면 조개 끝에 파란 파래가 붙어서 숨어도 날 잡아가시오 표시가 난다. 즉 파래를 잡으면 큰 조개는 함께 딸려 나온다.
여름이 되면 전국 어디서든지 와서 해수욕장을 찿는데 속초사람은 아바이 마을의 백사장을 더 선호한다. 주차비도 없고 방파제와 연결이 되어있어 무엇을 따도 얻는 것이 더 있기 때문이다. 속초의 거친 바람이 불고 나면 백사장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잔치가 벌여진다. 그것은 동전이 햇볕에 비추어 빛나기 때문에 용돈 정도는 너끈히 주울 수 있기 때문이다.
백사장은 때로 바다에서 멸치떼가 큰 고기에 쫒겨 백사장으로 튀어 나오는 장소요. 5.6월 미역 철이면 미역이 백사장으로 밀려나오는 곳이기도 하다. 지금은 그 광경을 찾아 볼 수 없지만 겨울철이면 도루묵(은어) 알을 주우려고 얼마나 다녔는지, 한 자루 가득차서 질질 끌고 다닐 때도 있었다. 또 백사장은 가난한 사람들이 밤새 떠 내려온 나무들을 주워 땔감을 구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가난한 자들이 나무를 줍고 있는 그 동안에도 서울에서 온 젊은이들은 사랑의 추억을 만들기에 바쁜 곳이기도 하다.
매일 밤 파도소리와 함께 자란 우리들, 파도의 소리만 들어도 기상을 예보해본다. 짧게 찰삭 거리면 샛바람이 올 징조요, 크게 파도가 퉁퉁 거리면 태풍이 올 징조요. 고요하듯이 속삭이면 오히려 불안하다. 예상치 못한 기상이변이 오기 때문이다. 날이 흐린 날이면 아침 일찍이 물총새(되박)들이 바다물이 오르내리는 경계선을 타고 총총 걸음으로 달린다. 그런데 그것들이 그냥 달리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튀어 다니는 톡톡이와 먹이감을 위해 뛰어 다니는 것이다. 물따라 오르내리면서 먹이를 줍는 물총새의 부지런함을 우리도 배워야하지 않을까
김포의 땅은 펄흙이라 1미터를 파는데 하루가 걸리지만 청호동은 어디를 파도 모래다. 몇분 걸리지 않는다. 좁은 지역 우물안의 개구리인 나는 모든 땅이 다 모래로 되어 있는 줄 알았다. 청호동에서는 집안에 세멘트로 집안 일을 하고 싶으면 한쪽구석을 파 내려가면 금방 하얀 모래가 속살을 드러낸다. 이 모래는 명태 고기잡는 어부들에게는 일을 쉽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다. 왜냐하면 낙시를 찍고(고기를 잡기 위해 미끼를 끼고 가지런히 놓는작업 : 한 함지에 300개 짜리 낙시 4개씩 1200개의 주낙이 필요함) 모래로 묻어두면 낙시를 바다에 뿌릴 때에 흥클어지지 않고 바다에 던져지게 한다. 겨울이 되면 이 모래를 얻기 위해 백사장에서 그릇에 담아 오는데 그 무개가 좀 무거워야지... 다 사는 방법이 어려서부터 고된 것을 누가알랴
초등학교 공부시간에 좀 덥다 싶으면 선생님의 명을 기다린다. 오늘 체육시간은 바닷가... 해수욕이다. 그러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창피도 모르고 벌거벗은 몸으로 백사장으로 가서 바다로 달려 들어간다. 준비한 체육복도 없다. 수영복도 없다. 원색적인 그 모습 그대로 바다로 뛰어 든다. 그렇게 놀던 그 시간들이 다시 올까, 살면서 무슨 형식은, 격식과 체면은 왜 그리 많은지... 그때 그 체육시간을 같이 딩굴던 친구들이 지금도 그립다.
나로서 가장 잊지 못하는 백사장은 내 여동생이 수영을 하다가 파도에 휩슬려 빠져 거의 죽은 것을 종식이 동생이 질질 끌고 우리 집까지 온 것이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 무식하게 끌고 온 것이 기도를 열게헤서 집에 오자 얼마 있지 않아 소생된 것이다. 또 학교에서 신발을 잊어버리면 맨발로 집에 오는 코스가 백사장이다. 엄마가 뒤틀린 검정 신발이라도 사줄 때까지 그 백사장이 언제나 도피 루트인 것이다. 그 어릴 때 50여 년 전의 어린 발자욱은 세월 속에 묻히고 새로운 발자욱을 남길 후세를 위하여 오늘도 백사장은 그 고운 자태를 드러내며, 동해바다와 함께 외로운 조도를 앞에 품고 속살을 드러내는가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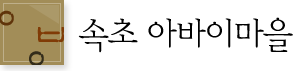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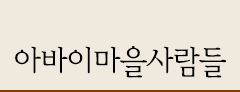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